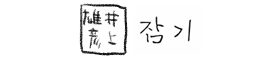키도 크고 실력도 좋다
10월 12일 장소: 후추 도요타 스포츠 센터
연습을 마친 다케우치 조지 선수(앨버크 도쿄)와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기사 보기 http://www.asahi.com/articles/ASJBL5S7NJBLUTQP01J.html )
2006년 사이타마 아레나에서 세계농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도카이대학 시절이던 그때부터 다케우치 조지는 10년 동안 일본 대표의 기둥을 맡아 오고 있다.
일본 농구계에 ‘민첩한 2m 7cm’라는 희대의 농구 천재가 그것도 2명이 동시에 등장하자, 일본 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다케우치 형제가 있는 동안에’라는 말이 수도 없이 회자되었다.
보기 드문 천재가 있는 동안에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이타마에서는 노비츠키를 보유한 독일에 선전했고, 뉴질랜드에는 승리 직전까지 갔으며, 파나마에는 승리를 거두었다. 1승 4패의 성적이었지만, 젊은 선수의 등장과 대표팀 강화의 성과는 확실히 느껴져 미래에 희망이 보였다. 그런데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강화 체제는 계속되지 못하고 일본 남자 농구는 혼미의 시기로 빠져든다.
세계는커녕 아시아에서의 지위도 잃게 되었고, FIBA(국제농구연맹)는 둘로 분열된 톱 리그와 협회의 행정 능력을 문제시. 2014년, 국제경기 참가 자격 박탈이라는 제재를 받고 일본 농구는 근본적인 개혁에 내몰리는 과정을 거쳤다.
B리그 첫해, 마침내 일본의 톱 리그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일본 농구는 마침내 상승 곡선을 탈 기회를 잡았다.
그 세계선수권대회로부터 10년.
다케우치 조지는 31살이 되었다.
*
키가 크면서도 실수 없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9년간 팀의 기둥으로서 뛴 선로커즈에서 앨버크로 이적.
다시 처음부터 시작. 팀 내에서 자신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편, 적이던 시절부터 앨버크는 우승이 당연시되던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준 높은 선수들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 팀에 적응시켜야 할 것인가?
개막 이후 팀 내에서의 역할을 찾는 시기가 계속되었다.
코치와 이야기를 나눠 보니, 단 하나의 역할을 맡는 롤 플레이어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끌어내 준다면 그것이 팀에 가장 보탬이 될 거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방황을 뿌리치고 자신만의 강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3라운드 지바 제츠와의 경기부터는 손의 감각이 느껴졌다.
마침내 앨버크의 일원이 된 것 같다.
충분히 생각하고 말수가 적다.
본질을 파악하려는 풍부한 감성이 느껴진다.
몸의 급성장에 운동능력이 미치지 못했던 소년 시절.
농구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는 큰 덩치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지만, 그것만이 무기였기 때문에 여유 같은 건 없었다. 사용할 수 있는 건 모두 사용하자는 식이었다.
중학생이 되어 몸의 성장 페이스가 안정을 찾은 후부터 기술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기술이 발전해 가는 과정의 재미에 빠진다.
큰 덩치를 이용하지 않고 1대 1로 붙어서 이기는 것이 즐거웠다.
그곳은 덩치와는 상관없는 대등한 승부니까.
중학교 선생님이 훅슛이나 페이드어웨이 등 당시라면 멋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들을 만한 슛도 쏘게 해 주었기 때문에 고마웠다. 그저 골 밑에서 공을 받아 몸을 돌려 슛만 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라쿠난고교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오사카의 중학생 시절, 강호 학교가 32강이나 16강부터 시드 배정을 받아 등장하는 가운데, 그들 팀은 1회전부터 싸워 이기며 쾌조를 보였다.
처음으로 자신들의 강점을 알게 된 그때의 기쁨, 기술이 발전해 갈 때의 설렘을 어제의 일처럼 설명했다.
모두가 인정하는 일본 농구의 기둥 중 하나가 된 지금도 그런 느낌이 농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때 농구를 시작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생초보부터 조금씩 발전해 갈 때의 설레는 느낌, 행복한 느낌은 그 후 만화를 그릴 때의 모티프이자 원동력이었다. 나는 몸이 큰 경험도, 강호 팀에서의 플레이도, 하물며 프로나 대표팀과도 거리가 멀었고 경험이 없지만, 조지 선수가 말한 설렘과 내가 경험한 그 설렘은 같을 거라고 느꼈다. 그렇다면 일본, 세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몇백만 명의 사람이 똑같은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생명일 것이다.
소년 시절에 큰 덩치를 이용하지 않고 대등한 승부에 나서기를 좋아했듯이, 다시 한 번 새로운 조건에서 조지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팀에, 세상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여 주려고 하는 중이다.
마쓰이 KJ나 다나카 다이키 등과 같이 훌륭한 슈터가 있는 팀에서 자신이 한복판을 드리블하며 달려가
슈터에게 패스를 해 주는, 그런 플레이를 해도 괜찮겠다고 말한다.
그것이 앨버크라는 팀이라면.
그런 장면을 정말 보고 싶다.
coast to coast*를 3경기에 1번(은 과장이지만) 정도는 보여 달라고 부탁했다.
앞으로 새로운, 아무도 몰랐던 다케우치 조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것은 그대로 일본 농구의 가능성을 끌어올린다.
보고 있는 사람도 가슴이 설렌다.
coast to coast–코트의 자기편 끝에서 상대편 끝까지 직접 공을 몰고 가서 마무리까지 하는 플레이. 보통 키가 큰 선수는 볼을 드리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하면 의외성과 박력이 넘친다. 이따금 샤킬 오닐이 이런 플레이를 해서 관객을 흥분시켰다.
2016.10.30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