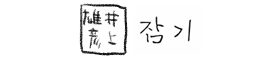오리모 다케히코(레반가 홋카이도) 선수와의 대담에서 느낀 것 등(후편)
(대담 기사 보기→ http://www.asahi.com/articles/ASJDQ4KB7JDQUTQP00K.html )
인간 오리모는 두 명일 수 없다.
구단 사장으로서, 또 선수로서, 혼자 몸으로 어떻게 그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 둘 중에 하나만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둘의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장이라고는 해도 농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도와주니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두 가지 일을 겸업하기 시작했을 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이 오지 않는’ 경험을 했다.
머릿속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잠을 자도 이내 눈이 떠진다.
“10시간까지도 너끈히 자던 제가 말이에요.”라며 그리워하듯이 웃는다.
성격에 모가 났던 젊었을 때와 구단 경영을 하는 지금은 관객과의 관계가 180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회사로부터 급료를 받고, 적은 관객 앞에서 플레이를 했다.
관객을 의식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게 나를 위해. 그 다음은 뒤를 이을 선수를 위해.
프로 농구 선수가 야구나 축구 선수보다 저평가되는 걸 이해할 수 없었고,
농구로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
열심히 협상해서 급료를 올려 받았다.
물론 거기에는 그럴 만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 결과, 다른 팀으로부터 “오리모에게 그렇게 많이 주지 말라(우리도 올려 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급료를 받았다.
그런데도 야구 선수와 비교하면 0이 하나 다르다.
대기업 팀인 도요타자동차에서 신흥 프로 팀인 홋카이도로 이적하고 그 대우의 차이에 충격을 받았다.
전용 연습장이 있던 도요타와 달리, 폐교의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버스로 6시간을 이동.
경기가 끝난 뒤, 저녁 먹으라며 500엔짜리 동전 하나를 받은 적도 있었다.
영문을 몰라 잠시 동안 그냥 서 있었다.
프로 구단은 당연히 티켓 수입이 없으면 꾸려 나갈 수 없다.
오리모는 팀의 간판 선수로서 팬이나 스폰서 앞 등, 여러 상황에 나서야 하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느꼈다.
그 전에는 경기나 연습, 훈련 등, 농구 자체를 위해 쓰는 시간 이외에는 자신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이었다.
그런 시간을 빼앗기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활동이 결실을 맺어, 홋카이도에서 ‘팀의 얼굴’로서 알려지게 되자 거리에서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는 빈도도 높아졌다.
부상 중일 때 등은 할머니 같은 분들한테서도 “빨리 나아라”, “빨리 돌아오라”고 격려를 받는다.
도요타 시절에는 없었던 일이다.
그러한 격려가 오리모의 의식을 서서히 바꾸어 갔다.
팀이 경영 파탄에 빠지자,
‘홋카이도 팀’의 존속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이사장 직을 떠맡는다.
스폰서가 되어 달라고 많은 기업인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또 직접 경영자가 되어 자신의 저금을 깨서 선수들 급료를 충당하기까지 했다.
“순식간이더군요. 지금까지 번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웃으면서 장렬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운동 선수가 있을까?
레반가 홋카이도는 현재 7승 23패로 동부 지구 최하위.
B리그 원년은 여기까지, 레반가에게는 힘든 시즌이 되고 있다.
계속 지기만 하는 것에 관해서는 니혼대학을 졸업하고 도요타에 입단했을 때의 낙차가 더 컸다.
당시의 니혼대학은 승승장구하는 팀.
도요타는 지금과 달리 도어 매트(언제나 짓밟히는) 팀이었다.
연공서열 사회였던 당시의 농구계에서 처음 몇 년은 계속 지기만 하는 아쉬움을 애써 참았고, 어느 정도 실적과 연차를 쌓고 난 후 스스로 팀의 의식 개혁에 앞장섰다.
첫 우승은 그 후의 일이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홋카이도로 이적한 후의 패배 수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
심신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코트 밖에 있었다.
코트는 자유가 남아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어 갔다.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그가 계속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세대 교체 같은 말 자체가 쓸데없는 참견이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든.”
말투에 힘이 들어간다.
아직 뛸 수 있는데 나이를 기준으로 출장 시간이 줄어든다.
→그 결과, 점점 더 뛸 수 없게 된다.
→은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이클은 비합리적이다.
젊은 선수와 전혀 다름없이 연습을 할 수 있고 성적도 남기는데, 그만둘 이유가 없다.
그만둔 후의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
‘레전드’라는 호칭은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약간 미안한 듯이 말한다.
훗날 되돌아보았을 때 그런 존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노장이라는 말을 듣는 건 좀, 하며 웃는다.
바로 이 사람에게 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
‘농구를 잘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오리모의 대답은 ‘지배하는 것’이었다.
경기가 5분 남은 상황을 예로 들어, 그 경기의 상황을 컨트롤 하고 연출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코트 위의 다른 9명을 움직이게 하는 선수.
결과적으로 반드시 이기는 선수.
그것이 ‘농구를 잘하는’ 선수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머리에 떠오른 사람은 동기 라이벌이자 함께 일본 농구를 이끌어 온 절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코 겐이치 선수(현 히로시마 드래곤 플라이즈 HC)였다.
‘농구는 가드다.’
그럼, 지금 B리그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역시 도치기 브렉스의 다부세 유타”
다부세의 뒤를 이을 차세대 B리그 스타 후보들에 대해 쓴소리도 했다.
“농구는 엄청 잘한다, 하지만 화려함이 없다.”
그 주장은 평범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렸다.
‘착한 아이들’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스토리가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싶어지는 스토리를 좀 더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만화로 치자면 ‘캐릭터 만들기’라고나 할까?
개성, 자기주장.
라이벌 간의 치열한 싸움, 볼썽사나운 충돌, 그 역사.
개인이 돋보여야 그 사람이 걸어 온 역사와 그 주변의 인물 관계에 관심이 커진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역사와 라이벌 관계 속에서 개인이 돋보이게 된다.
그렇게 해서 농구 전체의 스토리가 풍부하고 깊어진다.
관객을 능동적으로 당사자로 만들어 간다.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위험해진다.”
엄한 말투 뒤에는, 이번에야말로 이 B리그가 크게 발전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숨어 있다.
일본 농구의 변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다.
2017.01.20

최근 게시물